이글은 북한의 온정리 마을을 지원하는 농업경제 협력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안동교회( 서울 종로구) 북한선교단의 한 집사깨서 게시판에 남긴 글입니다. 북한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 게제합니다. ------------------------------------------------------------------.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면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산과 들이 황량하게 보인다. 비무장 지대라서 그럴까? 비무장 지대를 벗어난 듯한데, 갈수록 산과 들이 점점 더 황량하게 보인다. 어떤 산은 헐벗다 못해 흙이 드러나 있고, 어떤 산은 흙조차 붙어 있지 못해 바위나 돌이 드러나 있다. 산들은 거의가 거무칙칙하게 보인다. 들판에서는 주로 모래가 눈에 띈다. 이 지역의 토질이 본디 이런 것일까? 4-5년 전에 지었다는 민가도 한결같이 초라하다. 북한 어디를 가도 농촌에 있는 민가의 형태는 비슷하다고 한다. 곧, 텔레비전 방송에서 본 그 모양이란다. 온정리에 있는 ‘김정숙 휴양관’은 북한에서 4대 휴양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이마저 외관이 추레하다. 여러 해 버려 둔 탓일까, 바깥벽에는 검은 땟물이 줄줄이 흐른 자국이 그대로 있어 하얀 건물이라고 이르기도 어렵다. 구룡폭포가 있는 골짜기는 아름답다. 비룡폭포 천 길 낭떠러지기에 얼어붙었던 얼음을 타고 물이 떨어지니 참으로 장관이다. 이 무렵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한다. 지름이 수십 미터 쯤 되는 바위 통을 길이로 반을 갈라 비슥히 뉘어 놓은 듯한 곳, 그 바위 통을 옥류동 물살은 이름대로 백옥 같은 포말을 만들며 장대히 내린다. 그 바위의 물길 밖에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이 이제는 뭇 사람의 발길에 밟히고 있지만, 저 아름다움을 본 기록을 남기려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바위에 새겼을 테지. 관폭정에서 고개를 젖히고 쳐다보는 구룡폭포의 장관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괴팍한 화가 최북이 금강산은 그리지 못 하였다는 말뜻을 짐작할 만하다. 여기에도 폭포 저기에도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게 진짜 폭포이겠지. 바위에서나 돌에서 이끼가 별로 보이지 않을 만큼 계곡 물이 맑다. 둥글둥글한 돌들은 씻어 놓은 듯이 하얗다. 그런데도 한쪽으로 거칠고 황량하다는 느낌이 든다. 사람은 땅의 소산을 먹어야 산다. 저런 땅이 그리고 저런 산이 어떻게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줄 수 있을까? 밭에 있는 옥수수 그루의 굵기는 남쪽 것의 반(엄지손가락 굵기)도 안 될 듯 가냘프다. 저것의 줄기에는 작고 가냘픈 옥수수가 열렸을 테지.(열매의 크기가 정상적인 것의 4분의 1쯤이라고 한다.) 논의 벼 그루는 사이가 남쪽에 비해 촘촘하고, 그루가 가냘프다. 논이 척박하기에 빽빽이 심었을 터이고, 그루가 가냘픈 만큼 소출도 적었을 것이다. 이두순 박사가 “맞아, 벼가 무성해야 할 여름철에도 바닥이 보일 정도”라고 한다. 쌀이 남쪽에서는 1단보(300평)에서 500킬로그램 이상이 생산 되는데 북쪽에서는 200킬로그램 정도가 생산된다고 한다. 그나마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많은 양이 허실된다고 한다. 예전에 이곳 사람들이, 금강산 골짜기까지 올라와 죽은 연어 떼의 냄새가 하도 역하여, 연어가 올라오지 못 하게 해 주십사 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본 냇물은 그저 맑을 뿐, 냇가에서도 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끼도 보이지 않는다. 물고기가 별로 살 것 같지 않아 물어보니, 물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 삼일포로 가는 길에 까치를 보았다. “그러고 보니, 새고 짐승이고 별로 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끼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 우리를 안내하는 정 양이 “어마, 저는 여기서 여러 해 일했지만 꿩 날아가는 것은 처음 봐요.” 하였다. 삼일포의 솔숲 바닥을 보니 솔가리도 솔방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숲에서는 밟을 적에 푹신한 느낌이 들 만큼 솔가리가 쌓여 있어야 정상이다. 땔거리로 쓰려고 누군가 삭삭 긁어 갔기 때문이리라. 북에서 나는 석탄의 열량은 남쪽 것의 반도 안 된다고 한다. 그나마 배급량도 적다고 한다. 산들을 다시 살펴보니 사람 사는 곳에 가까울수록 거무칙칙하다. 금강산도 사람이 사는 근처는 거무칙칙하고 거칠다. 김기중 목사가 삼일포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무언가를 내밀며 집에 가지고 가서 장식품으로 간직하겠다고 자랑하였다. 무언가 하고 보니 가늘고 짧은, 손으로 꼰 새끼토막이었다. 이곳에선 똥도, 사람 똥이건 개똥이건 중요한 자원이 될 듯하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기술을 전해 주어야 할 듯하다. ‘고성 남새 온실농장’은 2월에 눈이 많이 내려서, 여러 동을 잇대어 만든 온실이 망가졌다고 한다. 현재 온실을 덮은 비닐은 4년이 지나 바꾸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안동교회가 이번에 지원한 돈으로는 주로 비닐을 샀다. 이곳 온실 농장에서는, 겨울철에는 주로 잎채소(상치, 쑥갓, 겨자 잎, 시금치 따위)를 생산한다. 한 온실에서는 여름철에 키울 열매채소(토마토, 멜론, 참외, 수박 따위)의 모를 키우고 있었다. 이곳 온실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여러 번 얼굴을 대한 사람들끼리는 쉽게 이야기가 오갔다. 저들은 ‘북고성군 농업협력단’에 필요한 자재를 적극 요청하였다. 저들이 요청한 자재와 양을 양측이 협의할 적에 이쪽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몇몇 종자는 필요한 양의 10여 배를 요청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의욕이 대단한 듯하다. “이제는 품질이 많이 좋아졌겠지요?”하고 물으니 “이제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야지요.”라고 대답한다. ‘수요’와 ‘공급’.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곳 온실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제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야’를 이해한 듯하다. (이번에 그들은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채소의 종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농장을 오가는 길에 버스를 탄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도 있었고 수줍어하는 아이들도 보였다. 2000년에만 하더라도, “미제의 앞잡이”라며 땅에 침을 뱉고 도망간 아이도 있었고 버스에 돌멩이를 던진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곳주민의 살결은 4-5년 전에 비해 많이 희어졌고, 여인네들의 살결도 많이 고와졌다고 한다. 입성도 나아진 듯하다고 한다. '아동 리발관', '온반', '남새상점' 등 색 칠한 간판이 보이는데, 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구룡폭포 쪽으로 오르는데 등 뒤에서 한 사람이 이곳 말씨로 말을 걸어 왔다.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쉰일곱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부리고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허리를 쫙 펴 보세요.” 김일성 배지를 단 이 젊은이는 장님, 벙어리, 꼽추, 셋이 금강선에 온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나와 같이 올랐다. 삼일포에서, 젊은 여자 지도원은 여러 차례 본 사람을 보고 먼저 인사말을 걸어왔다. 한국이 칠레와 에프티에이(FTA)를 체결하여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이곳에선 붉은색으로 쓴 구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빗물에 지워졌나 봅니다."라고 답변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 박사가 물었다. "남자 이름 같아서 어릴 때에 놀림받았겠군요?" "위로 언니가 많아서 아들 보려고 그렇게 지었나 봅니다." 북쪽에서도 산아제한을 했지만, 역시 거기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듯하다. 내가 물었다. "남새 온실농장에 가 봤나요?" "그럼요, 여러분들 참으로 그 많은 돈을 (경제적으로) 힘드시겠습니다." 헌출하게 생긴 남자 지도원에게 내가 말을 걸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습니까?”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대하시는 것도 달라지셨겠네요?” “남쪽 사람들 처음에는 저에게 말을 잘 하지 못 하였는데 이제는 잘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내게 직업을 물었고, 나는 '거위'와 '게사니'처럼 남북이 다르게 이르는 말이 있음을 알려 주니 신기해하였다. 금강원의 김치는 심심하면서 묵은 맛이 났다. 땅속에 묻어 두었던 듯하다. '접대원'이 자랑하는, 기름에 튀긴 도루메기 맛은 도루묵 맛이었다. 검은 털이 역력한 흑돼지고기 살점을 보니 사육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다. 만두는 서울 식 만두만 한데, 맛은 후춧가루 맛이 강하다. 냉면의 면발은 세면보다 고와서, 녹말로 만든 듯한데도 질긴 느낌이 들지 않았다. 국물 맛은 서울 사람 입맛에 맞춘 듯하다. 그곳 종사자에게 “평양식도 함흥식도 아닌데, 어디 식이냐?”라고 물으니 “그냥 금강산식이예요.”라고 짤막히 대답하였다. 어쩌면, '서울 사람 입맛에 맞춘 금강원 식'인지도 모르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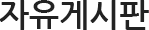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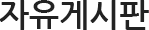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