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대 한국자연정보연구원장 기고 가끔 '환경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설 때가 있다. 강의에 앞서 화두(話頭)처럼 이런 질문을 꼭 던진다. “제비의 고향이 어디지요?”. 그러면 대개 ‘강남요!’라는 대답이 나온다. 틀린 답이다. 제비가 나고 자란 곳은 우리의 처마다. 처마가 바로 제비의 고향이다. ‘강남에 간 제비’라고 말할 때의 ‘강남(江南)’이란 중국 양쯔강 남쪽 아래 지방을 뜻한다. 그런데 ‘강남’은 제비가 먹이인 벌레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임시로 피해 가는 피난처(월동지)일 뿐이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람 수보다 제비가 더 많았다. 집집마다 한 둥지 이상 제비집이 있었다. 그런데 20여년 전부터 제비가 번식지인 우리나라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이젠 도시에선 제비를 구경하기가 어렵게 됐다. 급기야 서울시는 제비를 ‘보호야생조류’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제비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98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안다. 매년 민가(民家)가 있는 충청도 지역의 10㏊ 면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87년 2282마리였던 개체수가 1990년엔 1109마리, 1996년 155마리로 줄어들더니 올해에는 5월엔 13마리, 8월엔 22마리였다. 제비는 논에서 진흙과 짚을 물어다 처마에 집을 짓는다. 제비가 사람이 사는 민가에 집을 짓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새끼를 보호하자는 생각이다. 제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뱀이나 쥐 등 천적(天敵)의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지간한 농촌에서도 주택개량이 이뤄져 제비가 집을 짓기 어렵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벽면에는 진흙이 잘 달라붙지 않는다. 먹이도 많이 줄어들었다. 제비는 한 해에 두 번 번식하는데 보통 1차 번식에 5마리, 2차 번식에 4마리 안팎의 알을 낳는다. 14일 정도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데 이 갓 깨어난 새끼의 몸무게는 약 1.8g. 20여일을 키워 둥지를 떠나게 하는데 이 때까지 자식들은 엄청난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한다. 약 3주 내에 몸무게를 10배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부모 제비는 하루에 200마리 이상의 벌레를 사냥한다. 제비 가족이 월동지로 갈 때까지 약 5만 내지 6만 마리 정도의 벌레가 필요하다. 그런데 먹이의 공급처였던 농경지의 환경이 바뀌어 버렸다. 논과 농경지에 뿌려진 농약과 화학비료가 벌레들을 없애버린 것이다. 농약에 오염된 벌레를 먹게 되면 제비도 나쁜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교란물질의 섭취로 새끼를 제대로 낳지 못하거나 낳은 새끼도 비실비실해지고 마는 것이다. 문제는 제비에게 적합하지 않게 변한 환경이 인간에게는 괜찮겠느냐는 점이다. 논은 우리의 주식인 쌀의 생산 공간이다. 제비만큼이나 사람도 논에 의존한다. 그런 논의 환경파괴로 제비가 멸종해가고 있는데 사람은 멀쩡한 것일까. 제비가 생물학적 존재라면 사람도 생물학적 존재다. 몸무게가 가벼운 제비는 좀 일찍 독성(毒性)이 나타난 것이고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은 아직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눈알에 노란 빛이 돌면 황달이라고 의심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질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여 안약으로 치병(治病)하겠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눈에 나타난 증상이 간의 이상을 알리는 징후인 것을 빨리 알아야 간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지금 제비의 위기는 사람의 위기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증후군(症候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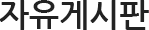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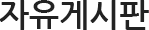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