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06년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게제된 서울 대공원의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동물보호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정성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전문을 게제합니다. ---------------------------------------------------------------------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살던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는 재작년 2월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에 놀라 날아오르다 철망에 부딪혀 간이 파열된 것. 평균 수명 50년인 이 새의 나이 겨우 두 살 때 일어난 비극이었다. 작년 11월 국제 보호종인 바라싱가 사슴의 4개월 된 새끼는 비둘기 포획망이 넘어지자 놀라 날뛰다 철망을 들이받고 죽었다. ‘히말라야의 진객’이라며 작년 봄 들여온 포유동물 렛서팬더 한 쌍 중 네 살짜리 수컷은 올해 8월 간염으로 불귀의 객이 됐고 몸값 1322만원도 허망하게 날아갔다. 349종 3000여 마리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동물 대부분은 이렇게 제 수명을 못 누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두완 서울시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서울대공원에서 입수한 ‘최근 3년간 폐사동물 사인(死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죽은 516마리의 동물 중 ‘늙어서 죽은’ 동물은 전체의 6%에 불과한 31마리였다. 나머지 동물 중엔 폐와 장 관련 질환을 앓다가 죽어간 동물이 유독 많았다. 장염으로 폐사한 동물은 지난 3년간 119마리(23%)에 달했다. 한창 소풍철이던 지난 5월 23~28일 엿새 동안 한데 어울려 사는 큰고니·검은고니·캐나다기러기 등 물새 20마리가 집단 장염 발발로 떼죽음당했다. 먹이를 잘못 먹은 한 마리가 장염을 퍼뜨린 것이다. 폐렴으로 죽은 동물도 42마리나 됐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려 죽은 ‘사고사(事故死)’는 15%에 달하는 79마리였다. ‘야성’을 잃은 대신 ‘안락한 삶’을 누려야 할 동물들이 국내 최고의 동물원에서 야생만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부두완 의원은 “콘크리트 벽과 바닥, 철망으로 된 우리에 갇혀 먹고 마시는 동물들의 장과 폐가 멀쩡하다면 그게 비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의 최근 2년간 평균 폐사율은 5.8%로 타이완의 타이베이동물원(연평균 6.15%)이나 일본 우에노동물원(2004년 18.8%)보다 오히려 낮은 편. 문제는 ‘죽음의 질’이다. 1984년 문을 연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좁고 낡은 우리 탓에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2002년에는 콘크리트·철창 속 동물의 비참한 삶을 다룬 ‘슬픈 동물원’이라는 보고서가 외부에서 발간돼 충격을 줬고 대공원에서는 “2012년까지 우리를 다 개선하고 동물도 20% 줄여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며 ‘선진화 10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디즈니랜드’ 때문이다. 동물원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李明博) 전 시장이 ‘과천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뒤 대공원 이전설이 나돌자 서울시가 지원을 아예 끊었다”며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동물원은) 오래 못 간다는 위기 의식이 퍼져 있다”고 털어놓았다. 동물원은 ‘10개년 계획’이 무산되자 작년 내부적으로 다시 ‘서바이벌 플랜’을 짰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000여억원을 들여 기존 우리를 ‘준(準)사파리공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 동물원은 이 계획을 오세훈(吳世勳) 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관심을 끊은 서울시가 다시 지원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지섭기자 xanadu@chosun.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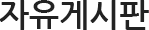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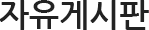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
홈 > 고객센터 > 자유게시판